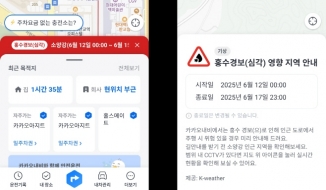뉴욕 카네기홀 초청으로 미국 투어...공동주최로 오페라도 공연
|
정재왈 서울시향 대표의 취임 일성이다. 정 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재단 출범 20주년, 창단 80주년을 맞는 서울시향이 이제는 정말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간 한류의 급속한 성장을 바라보면 서울시향이 베를린필을 경쟁상대로 삼는 것이 허황된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이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유럽무대에서는 한국 아티스트들이 없으면 공연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한 자양분을 활용한다면 십년 뒤 베를린필과 겨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올해 재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인 뉴욕 카네기홀 초청으로 미국 투어에 나선다. 10월 27일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미시간, 오클라호마 등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ARD 국제 음악 콩쿠르를 필두로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콩쿠르 사냥꾼'으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2021년 부소니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함께 신동훈 작곡가의 음악 등을 들려준다.
정 대표는 "미국 동부 지역을 공략하는 해외 공연에서 김봄소리, 박재홍 등 우수한 우리 음악가들과 함께 클래식 한류를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향은 얍 판 츠베덴 예술감독의 진두지휘 아래 말러 교향곡 전곡 음반 녹음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클래식 전용 앱 '애플 뮤직 클래시컬'을 통해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음원을 공개한 시향은 올해 말러 교향곡 2번 '부활'과 7번을 선보인다. 총 5년 간 해마다 2회 이상 녹음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츠베덴 감독을 깊이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츠베덴 감독의 어떤 것들이 서울시향의 색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향의 오랜 숙원인 전용 콘서트홀 확보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 대표는 "전용홀 설립이 10년 안에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서 설립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용홀이 없기 때문에 공연 대관료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다"며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두 곳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은 경쟁이 치열해 대관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원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조직 내부 혁신 계획도 밝혔다. 공석인 악장을 채용하고 단원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으로 LG아트센터 운영국장,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향의 7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